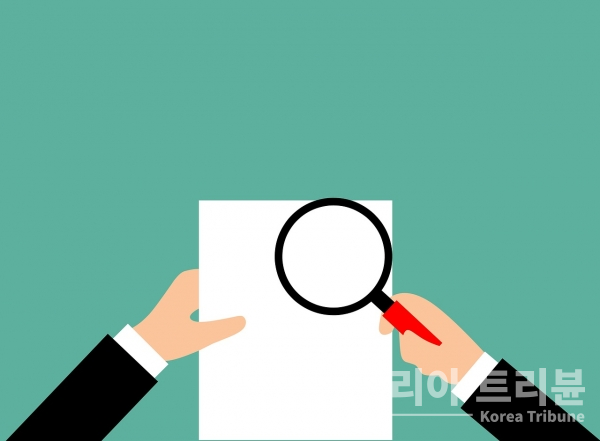
[코리아트리뷴] 잊을 만하면 뉴스를 장식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논문 표절’이다. 선거철이나 인사청문회 시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로 잘 근무하던 교수나 고위 인사들을 한 순간에 쫓아내는 폭탄이 되기도 한다. 오죽하면 선거 출마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고위 공직자에 뜻을 둔 사람은 애초 논문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우스갯 소리마저 있을까.
인사청문회 등 검증 절차는 그만큼 까다롭고 쉽게 통과하기 어렵다. 표절 혐의를 받으면 보통 출처 표시가 일부 누락됐을 뿐이라거나, 논문 작성 당시 허용했던 행위가 지금은 금지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됐다고 항변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지 모르나, 국민의 시선이 싸늘한 경우가 많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 요즘은 논문 표절 여부 검증도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정보를 이용한다. 표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해주는 사이트도 생겼고,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필수로 논문 표절 검사를 제출해야 하는 석·박사 학위 논문 심사에서는 물론이고, 이제는 학술 논문 접수를 할 때도 논문 표절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학회가 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일정 어절 이상이 기존의 책 또는 논문과 겹치는 경우 표절로 보고, 내 논문 중 표절 분량이 몇 퍼센트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기존의 책·논문에서 어느 부분과 얼만큼 겹치는지 알려주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정확한 페이지까지 보여준다.
이런 까닭에 표절 검사 결과지에 기재된 표절률이 높으면, 논문 심사위원들은 그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한다. 논문 통과가 급한 작성자는 부랴부랴 해당 부분의 표현을 바꿔가며 표절률을 낮추기 위해 애쓴다. 일단 조사나 어미를 바꾸고 그래도 표절률이 높으면 단어나 문장 구조를 바꾸기 시작한다. 너무 많이 바꾼 듯하면 인용이나 출처로 보기 어려울까 싶어 출처 표시를 삭제하기도 한다.
논문 작성자 중에는 인용할 때마다 한 문장씩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 한 번에 몰아서 표시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출처 표시를 누락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또 처음에는 제대로 출처 표시를 하지만, 여러 번 심사를 거치면서 개별 문장이나 단락의 위치를 자주 바꾸다 보니 본의 아니게 출처 표시가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여러 과정을 거쳐 나름대로 표절률이 낮게 나오면, 그제서야 논문 작성자와 심사위원 모두 논문 표절과 관련해 안심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든 표절률만 낮추면 정말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표절 검사 사이트의 표절률이 높으면 그 논문은 표절 논문인가? 논문을 쓸 때면 기존의 자료를 생각보다 많이 인용한다. 지금까지 연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새로운 지식도 발견하거나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논문은 에세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내 생각만을 늘어놓을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숟가락에 관한 논문을 쓴다면, '숟가락은 무엇이다'하는 그 개념 정의 자체를 논문 작성자가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없다. 결국 지금까지 숟가락에 대해 연구한 기존 학자들 중 가장 저명한 사람의 개념 정의를 인용해야 한다. 그 외에도 숟가락의 기원, 연혁, 발전 과정, 유형, 분류, 사용례, 다른 식기와의 비교 등 기존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지 않고 임의로 정의하거나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다만 학교나 학회, 혹은 전공에 따라서 인용이 많은 논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우 심사위원이 인용 부분을 줄이라는 요구를 하면, 분명 기존의 연구 자료에서 가져온 내용인데도 출처 표시를 삭제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러면 마치 그 내용 전부가 논문 작성자의 글인 것처럼 둔갑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진짜 표절 논문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가 초래한 현상이다.
'표절'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서 그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 법적으로 보면 '저작권 침해'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래서 타인의 글을 인용할 때에는 일단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홍익대 법과대학 오승종 교수는 그가 펴낸 「저작권법」에서 "인용을 하면서도 인용되는 저작물을 함부로 수정 또는 개작하는 것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원문 그대로 또는 원형 그대로 인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따르면, 표절률을 낮추기 위해 단지 조사나 어미를 바꾸고 단어만을 교체했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단순히 표절률만 낮췄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다. 표절 검사 사이트의 표절률 수치가 높다는 것보다, 그 인용한 부분에 출처 표시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어찌보면 무조건 표절률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심사위원과 그러한 시스템을 탓할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이면 모든 책임은 결국 논문 작성자가 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논문에서 인용을 할 때는 최대한 원문 그대로를 인용하고 반드시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표절률을 낮추기 위해 타인의 글을 인용하면서 원문을 함부로 변형하거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는 결국 표절 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기준으로도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변형하거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는 분명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이를 미리 대비하지 않고, 일이 터진 뒤에야 본인이 논문 작성 할 당시는 허용했던 관행적 행위였다며 용서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태다. 논문 저술의 시작에서부터 저작권 개념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문화가 필요하다.
김희권 문화예술학박사

